유대감 강화·공동체 의식 키워
그 고마움 모른 채 사는 인간에
가끔 화마로 돌변해 시름 안겨
불을 본 지 오래되었다.
장작 위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은 언제 보았는지 기억조차 아득하다.
요즘 일상에서 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집에 벽난로가 있는 극소수가 아닐까. 주방의 가스레인지 불꽃이나 길거리에서 담배 태우는 사람의 라이터 불꽃도 불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말이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석기시대에 이르면, 불은 집의 중심이었다.
충남 공주시 석장리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 ‘막집’과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움집’의 흔적을 보면, 집 가운데에는 어김없이 돌을 쌓아 만든 화덕이 있었다.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중심에는 항상 불이 있었다.
그들은 매일 불을 바라보고 그 온기와 열기를 느끼면서 생활했다.
막집과 움집 모두 하나의 실내 공간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히고, 도구를 만들고, 추위를 쫓았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 사람들은 불을 피워놓고 주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만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강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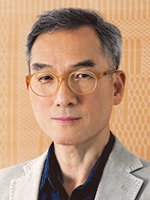 |
|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은 음식을 익히고 방을 데우는 아궁이에 가두었다.
자칫, 화마가 집을 집어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때는 요즘에 비하면 불을 볼 기회가 많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고 겨울이면 행여 방이 식을세라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길을 살펴야 했다.
그래서 그런지, 전통 사회에서 불은 신성한 것이었고 기운이 다한 불은 버리고 절기(節氣)에 따라 새 불씨를 만들어 썼다.
이를 ‘개화(改火)’라 했다.
조선 태종 6년(1406), 임금은 예조의 건의로 ‘개화령’을 내렸는데, 예조에서 내세운 개화의 당위성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불씨를 오래 두고 변하게 하지 아니하면, 불꽃이 빛나고 거세게 이글거려 양기가 지나쳐 여질(전염성 열병)이 생기는 까닭에 때에 따라 새 불씨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나무를 문질러 불을 일으켜 불씨를 새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는 푸르기 때문에 봄에 불을 취하고, 살구나무와 대추나무는 붉기 때문에 여름에 취하고, 뽕나무와 산뽕나무는 누르기 때문에 땅의 기운이 왕성한 유월에 불을 취하고, 조롱나무와 졸참나무는 희고 회화나무와 박달나무는 검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각각 그 철의 방위 색에 따라 불을 취합니다.
불은 사람이 상용하므로 그 성질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오래되고 법이 폐지되어 불씨를 바꾸는 법령이 오랫동안 행해지지 않아 음양을 고르게 다스리는 도리에 미진함이 있었습니다.
”
음양오행설에 따른 오방색(五方色)에 의하면, 봄은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로 해가 뜨는 동쪽과 청색이나 녹색을 의미한다.
여름은 태양이 강렬한 계절로 남쪽과 붉은색을, 가을은 결실의 계절로 해가 지는 서쪽과 흰색을, 겨울은 어둠과 휴식의 계절로 해가 약한 북쪽과 검은색을 가리킨다.
사계절의 균형을 이루는 중앙은 생명의 근원인 땅을 상징하는 누른색이다.
이에 따라 불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하는 나무도 절기에 따른 색깔에 맞추었다.
개화령에 따라, 입춘, 입하, 토왕일(土旺日), 입추, 입동에 서울에서는 내병조에서, 지방에서는 수령이 있는 관아에서 불씨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토왕일은 음양오행에서 땅의 기운이 왕성한 날로 입추 전 18일이다.
내병조는 임금을 모시고 호위하는 일과 의식에 쓰이는 무기와 도구 등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궁궐 내에 있는 병조의 부속 관아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개화를 위해 새로운 불씨를 만들 때 나무를 문질러 불을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나무를 문질러 불을 만드는 것은 석기시대 이래 인간이 불을 얻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었으니, 새로운 불씨를 얻는 개화는 원시시대의 방법이 전래하여 조선까지 이어진 것이다.
개화는 원래 ‘나무꼬챙이를 나무판에 대고 두 손으로 비벼 불을 바꾼다’는 ‘찬수개화(鑽燧改火)’의 줄임말이다.
이렇듯 소중한 불이지만, 불은 자칫하면 화마로 돌변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위험천만한 것이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했다.
특히 나무로 집을 지었던 조선시대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항시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대비책은 부적이었다.
대들보에 용이나 거북을 그리거나 용과 거북 혹은 물 수(水) 자를 사용해 만든 부적을 지붕 속에 넣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요즘은 집에서 불을 다루고 볼 기회가 거의 없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각 가정에 방구들과 연결된 아궁이가 있어 아궁이에 장작을 때거나 무연탄에 불을 붙여 넣었기에 그나마 매일 불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가정에서 온수 파이프와 연결된 가스 또는 기름보일러로 방을 데우니 불을 볼 일이 없어졌다.
불의 고마움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은 가끔 화마로 돌변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다.
최근 영남지방 산불로 산림은 물론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온 국민이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렀다.
2022년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매일 엄청난 불덩이들이 상대방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소소하게 불을 대할 일은 줄어들었지만, 대형 화재와 전쟁은 그치질 않는다.
노아의 방주 후 최후의 심판은 불일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예사롭지 않다.
세월이 하 수상하니, 입춘이 한참 지난 지금이라도 느릅나무와 버드나무 꼬챙이를 비벼 새 불을 얻어 광화문 앞에서 그 불씨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심정이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